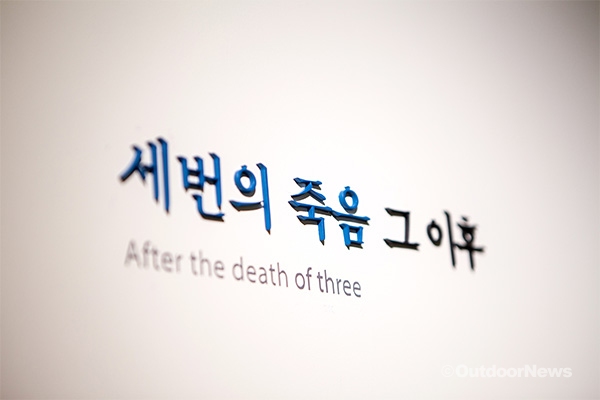당신이 아직 모르는 - 고흥
고흥은 낯선 곳이다. 우리나라 남해안 지도를 살펴보면 동쪽부터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여수 등 익숙한 지명을 차례로 지나 고흥에서 잠시 머뭇거리게 된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 편 제작진이 고흥의 득량도를 촬영지로 택했지만, 여전히 아득하게 다가오긴 마찬가지. 남해안 끄트머리에 큼지막한 보따리처럼 걸쳐 있는 고흥 반도에는 완만한 구릉부터 잔잔한 바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은둔한 섬까지,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풍경이 넘실거린다.
 |
| 뭍사람의 손이 덜 탄 곳,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고장. 고흥. |
전남 고흥은 230개의 섬을 거느리고 있다. 봄 햇살이 부서지는 하늘 아래 옥보다 맑은 바다가 있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쪼는 파도가 있다. 나지막한 산과 온화한 숲이 손 내밀면 닿을 곳에 있다. 아직 때가 타지 않은 이 고장은 한눈에 다 보고 올 수 있는 여행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뜨거운 계절을 맞이하는 소록도와 연홍도를 다녀왔다.
 |
| 2009년 거금도까지 이어지는 다리가 생기면서 소록도는 오고 가기가 더 편리한 섬이 됐다. |
시리도록 아름다운 소록도
녹동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소록도(小鹿島). ‘천형(天刑)의 땅’으로 불리던 소록도는 섬 면적이 겨우 4.42㎞에 불과하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이 삶을 버텨야 했던 가슴 시린 섬이다. 2009년 거금도까지 이어지는 연륙교가 생겨 오고 가기가 편리해졌다.
소록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섬 모양이 작은 사슴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입구에서 만난 ‘수탄장(愁嘆場)’은 일제강점기 인권을 유린당했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한센병에 걸린 부모들이 핏덩어리 같은 자식과 한 달에 한 번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만났던 곳이다. 해안가로 들어서자 나무 데크로 만든 산책로를 따라 저 멀리 1916년 세워진 소록도 병원이 또렷하다. 득량만은 잔잔했다.
 |
|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 박물관의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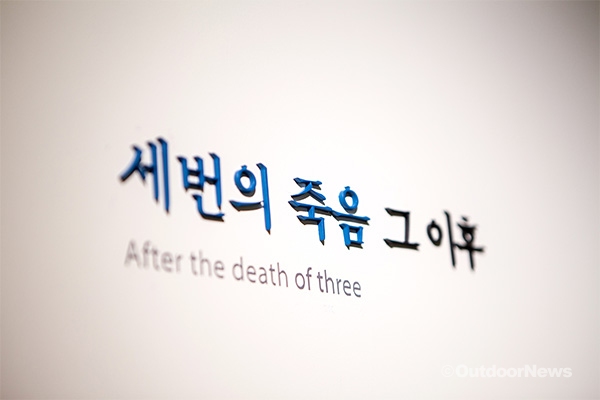 |
| 한센병은 세상과 격리되며 한 번, 해부되며 육신이 찢겨 두 번, 죽어서도 그대로 묻히지 못해 세 번 죽는 병이었다. |
 |
| 한센병 박물관 한쪽에서 발견한 세월의 흔적. |
“아무 죄가 없어도 가두어 놓고/ 억울한 호소는 들을 자 없으니/ 참아야 될 줄 압니다.” ‘감금실’ 앞에 걸려 있는 메모를 읽는데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 고통스럽다. 일평생 수모를 겪어야 했던 한센인들은 일본인의 눈에 거슬리면 법적 절차도 없이 독방에 갇혀 한 달 이상 매질을 당하고 끼니를 굶어야 했다. 병에 걸려 한 번 죽고, 시체로 해부돼 두 번 죽고, 화장터에서 불태워져 세 번 죽었다.
6000여평의 중앙공원은 잘 꾸며진 수목원 같다. 한센인들이 동원돼 만들어졌다. 거기서 쉬고 논 사람들은 일본인들이었다. 소나무, 향나무, 종려나무 사이로 사슴들이 뛰노는 정원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가 소중했다.
 |
| 환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감금실. 일제강점기 인권탄압의 상징물이다. |
 |
| 스산한 분위기가 감돈다. |
 |
| 한센인들의 희망을 담은 중앙정원의 동상. |
소록도 가는 길
국도 27호선을 타면 소록대교를 지나 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 녹동항에서 소록도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에 여섯 차례있고, 광주에서 바로 오는 버스는 하루에 총 2대 운행한다.
섬 미술관 연홍도
거금도에서 배를 타야만 하는 ‘섬 속의 섬’ 연홍도는 해안선 둘레가 겨우 4㎞인 자그마한 섬이다. 푸른색과 붉은색 지붕 사이로 파릇한 밭고랑이 보이는 연홍도 건너편으로는 기암이 아름다운 완도 금당도가 지척이다. 거금도 신촌리 신양 선착장에서 연홍도까지는 500m 남짓. 10명 이상 타지 못하는 5.9t짜리 여객선에 몸을 싣고 채 5분이 걸리지 않아 닻은 내려졌다.
 |
|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2천여 벌의 티셔츠 전시품. |
 |
| 섬 곳곳에 위치한 예술작품들이 고즈넉한 섬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
연홍도에 닿는 순간 하얀 소라 껍데기와 자전거를 타고 바람개비를 돌리는 아이들 조형물에 시선이 머물렀다. 미술관으로 안내한 것은 털이 하얀 강아지 ‘연홍이’였다.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연홍이가 골목 구석구석을 안내하는 가이드였다. 낮은 담벼락에 앙증맞게 그려진 벽화 앞에서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연홍도에는 51가구 82명이 산다. 10분쯤 걸었을까, 폐교 건물에 들어선 ‘연홍 미술관’ 앞마당에서 그만 두 발이 박혔다. 눈앞에 기암절벽이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데 완도 금당도라고 했다. 미술관 안으로 들어서자 ‘파란 물고기’ 그림에 마음을 빼앗겼다.
 |
| 골목 담벼락에서 마주친 부표의 변신. |
 |
| 연홍도 입구에 자리한 소라 구조물. |
 |
| 연홍미술관은 지금의 연홍도가 있게 한 곳이다. |
철따라 상사화, 국화 같은 꽃들이 많이 핀다는 언덕에 올랐다.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팽나무 한 그루가 우뚝했다. 밭고랑에는 양파와 마늘, 갓이 파릇파릇했다. 문화해설사와 눈인사를 나누던 주민이 기분 좋게 팔을 이끌고 기어코 집 안으로 들여 해삼을 대접한다. 막 데쳐서 썰어낸 해삼의 탱글한 식감이 신선해 달달하기까지 하다. 아직 뭍사람의 손이 덜 탄 전남 고흥은 지금 당장 또다시 가고 싶은 고장이다.
 |
| 담장마다 그려진 색색깔 벽화가 재밌다. |
연홍도 가는 길
거금대교를 건너 금산면 사무소를 지나가마자 중촌삼거리에서 배천·신양 방면으로 우회전해 2.7㎞를 가면 연홍도 가는 배가 뜨는 신양선착장이다. 이곳에서 하루 일곱 번 연홍도 가는 배가 뜬다. 오전 7시, 8시, 9시 50분, 낮 12시 30분, 오후 2시 30분, 4시 30분, 5시 30분. 배를 타면 10분이 채 안돼서 연홍도에 도착한다.
저작권자 © 아웃도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